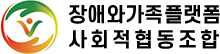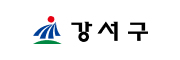[에이블뉴스]고령 장애인의 자립, ‘이제와서’가 아닌 ‘이제라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0-28
본문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가지 공통질문을 받는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생존해 계시느냐?”가 첫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텐데 결혼 생각은 없느냐?”고 묻는다.
나이를 막론하고 미혼남녀들이 넘처나는 시대에 곧이 혼인 여부를 물어봐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질문한 분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결혼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곤 한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외였던 모양이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지, 혹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지를 묻고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과 편히 살지 않고 왜 나와서 고생하느냐”고 안타까워하며 기왕 나왔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며 힘내서 잘살아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자네도 이제 중년인데,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나온 거냐” 고 물어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진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나에게 그 말을 했던 어르신은 장애를 가진 50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80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저 몸이 시원치 않은 자식은 내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살았던 부모들이 늙어가는 자신과 함께 중년이 되어가는 자녀를 보며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자녀가 중년이 되어 가는 나이라면, 그 자녀들이 한창 자라던 시기에는 한 반에 50명 이상이 모여 공부하던 시기로, 대부분이 가정에는 장애 자녀를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의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보다는 본인 혹은 자녀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는데 좀 알아봐라 라거나,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자녀들은 많지 않기에 장애인 자녀의 독립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자료조사는 결국 남은 형제자매들이 하게 되기에, 남은 가족들도 자료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다.
이렇게 쌓인 정보들이 쌓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혼자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식주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지 혹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가진 재산으로 어느 부분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식구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명절 혹은 생일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미리미리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쌓인 정보들이 적절한 때 활용되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독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어떡하지” 아닌, “이전부터 준비했던 독립”이 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이를 막론하고 미혼남녀들이 넘처나는 시대에 곧이 혼인 여부를 물어봐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질문한 분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결혼이 필수였던 시대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결혼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곤 한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외였던 모양이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지, 혹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지를 묻고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과 편히 살지 않고 왜 나와서 고생하느냐”고 안타까워하며 기왕 나왔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며 힘내서 잘살아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자네도 이제 중년인데,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나온 거냐” 고 물어와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진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나에게 그 말을 했던 어르신은 장애를 가진 50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80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저 몸이 시원치 않은 자식은 내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살았던 부모들이 늙어가는 자신과 함께 중년이 되어가는 자녀를 보며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라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자녀가 중년이 되어 가는 나이라면, 그 자녀들이 한창 자라던 시기에는 한 반에 50명 이상이 모여 공부하던 시기로, 대부분이 가정에는 장애 자녀를 제외하고 한 명 이상의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은 이미 노년에 접어든 장애인 당사자의 부모보다는 본인 혹은 자녀들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는데 좀 알아봐라 라거나,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자녀들은 많지 않기에 장애인 자녀의 독립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자료조사는 결국 남은 형제자매들이 하게 되기에, 남은 가족들도 자료조사를 하며 자신들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다.
이렇게 쌓인 정보들이 쌓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혼자 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식주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을지 혹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가진 재산으로 어느 부분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방법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 식구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명절 혹은 생일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미리미리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쌓인 정보들이 적절한 때 활용되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독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어떡하지” 아닌, “이전부터 준비했던 독립”이 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