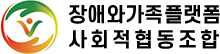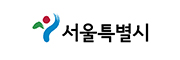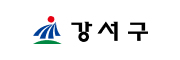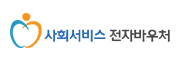[에이블뉴스]어설픈 선의가 더 나빠, 장애인 편의시설의 모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02
본문
얼마 전 햄버거를 먹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방문했는데, 휠체어 모양이 그려진 키오스크를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2대에 비해 조금 낮은 이 키오스크는 ‘고객 눈높이 맞춤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신장이 작은 사람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이 패스트푸드점에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키오스크가 생겼구나!’ 기뻐하던 찰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 앞에는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입구가 있나 살펴봤지만, 매장 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이 업체는 지난여름, 언론을 통해 ‘배려형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며, ‘휠체어 이용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 키오스크 대비 높이를 낮춘 1530mm로 구축했으며, 1200mm 높이 이하로 화면 배치가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 도입으로 보다 쉬운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설치였을까요?
어설픈 선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쇼핑카트를 갖춰놨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만들어놓은 단방향 냉장고는 장애인 편의를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물건을 꺼내기 여간 불편할뿐더러, 범위조차 좁아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왜 휠체어 카트를 가져다 놓았는지, 휠체어 사용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이 어설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앞에서 언제까지 화만 내야 할까요?
올해 기자가 꼽은 장애계 뉴스는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입니다.
이 소송은 지체장애인 김명학 씨 2명, 그리고 유아차를 미는 부모 1명 등 총 3명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매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차별구제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1998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지만,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다며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95% 이상의 소매점이 편의 제공 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을 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단 주장이었죠.
긴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 책임이 맞다”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판결에도 우리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매점 95%가 장애인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50㎡(약 15평) 이상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법 시행 후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법을 계속 고치지 않으면 10년 후 ‘장애인 접근권’이 또다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을 해결해야, 이 어설픈 장애인 편의시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1984년 서울의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고 김순석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정부는 대법원이 남겨준 숙제를 잘 풀어나가길 기다립니다. 마음 놓고 식당에, 카페에, 편의점에 가는 게 소망이 아닌,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드디어 이 패스트푸드점에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키오스크가 생겼구나!’ 기뻐하던 찰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매장 앞에는 턱이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입구가 있나 살펴봤지만, 매장 입구는 하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이 업체는 지난여름, 언론을 통해 ‘배려형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며, ‘휠체어 이용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 키오스크 대비 높이를 낮춘 1530mm로 구축했으며, 1200mm 높이 이하로 화면 배치가 가능한 ‘낮은 화면 모드’ 도입으로 보다 쉬운 조작 환경을 제공한다.‘고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의 설치였을까요?
어설픈 선의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쇼핑카트를 갖춰놨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만들어놓은 단방향 냉장고는 장애인 편의를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물건을 꺼내기 여간 불편할뿐더러, 범위조차 좁아 사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거면 왜 휠체어 카트를 가져다 놓았는지, 휠체어 사용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이 어설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앞에서 언제까지 화만 내야 할까요?
올해 기자가 꼽은 장애계 뉴스는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입니다.
이 소송은 지체장애인 김명학 씨 2명, 그리고 유아차를 미는 부모 1명 등 총 3명의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매점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면서 차별구제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1998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됐지만,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다며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300㎡(약 90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95% 이상의 소매점이 편의 제공 의무에서 면제됐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입법을 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단 주장이었죠.
긴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의 판단은 “국가 책임이 맞다”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판결에도 우리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소매점 95%가 장애인 접근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50㎡(약 15평) 이상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법 시행 후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법을 계속 고치지 않으면 10년 후 ‘장애인 접근권’이 또다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을 해결해야, 이 어설픈 장애인 편의시설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1984년 서울의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고 김순석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며, 정부는 대법원이 남겨준 숙제를 잘 풀어나가길 기다립니다. 마음 놓고 식당에, 카페에, 편의점에 가는 게 소망이 아닌,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